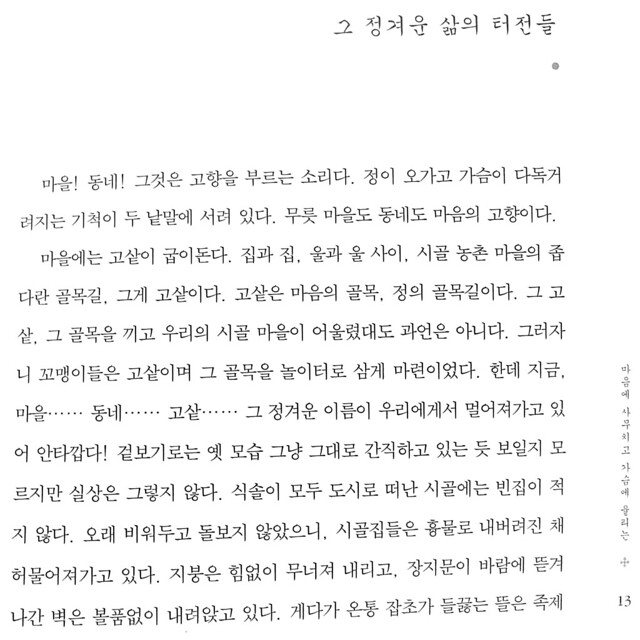이젠 없는 것들. 김열규. p209
그리움은 아쉬움이고 소망이다. 놓쳐버린 것, 잃어버린 것에 부치는 간절한 소망. 그런데 이제 바야흐로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애달픔에 젖는 것, 그건 뭘까? 지금은 가고 없는 것, 지금은 사라져버린 것, 하지만 꿈엔들 못 잊을 것은 뭘까? 그래서 서러움에 젖는 건 또 뭘까?
우리들의 정서가 기틀을 잡은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것, 우리들 누구나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것, 그래서 한시라도 잊지 못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하고많다. 너무나 많아지고 말았다. 없어졌기에 차마 잊을 수 없는 것! 사라져버렸기에 오히려 더 마음에 사무치는 것! 그래서 고향과도 같고 어머니 품과도 같이 정겨운 것! 여기 그런 것을 다독거려놓았다. 가만가만 등 두들기고 가슴 어루만지듯이 챙겨놓았다.
마을은 한국인이 대대로 살아왔고, 또 지켜온 생활의 터전이요 모태 같은 공간이다. 그런데 어머니 품과도 같은 바로 그곳이 지금은 헐벗고 있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마을은 폐허로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의 오래고 오랜 문화며 생활양식이나 풍습도 기울어가고 있다. 한국적인 전통이 이울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마음에서 우리들 고향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샅길’이란, 길은 길일 테지만 그 구체적인 모양은 잘 떠오르지 않을 것 같다. 고샅, 고샅길… 그런 건 도시에 없기 때문이다. 거리는 있어도 고샅이며 고샅길은 눈을 비비고 보아도 안 보인다.
솟대와 장승
징검다리
외나무다리
나루와 나룻배
서낭당. 본래 한자로는 ‘성황당’, 하지만 그게 우리말로 동화해서 서낭당이 되었다. 더러 산신당이라고 불리기도.
대장간. 대개 사람들 사는 동네 바깥. 길섶에 자리. 무당과 야장은 지나간 시절에는 천대를 받았다. 그러자니 마을 안에서는 그들이 살 수 없었다.
구멍가게. 왜 구멍 자가 붙었는지, 그건 제대로 알 수 없다.
방아, 물레방아.
우물. 대개 공동 우물. 우물가는 마을 여성들의 광장. 마을의 여론과 중론이며 공론이 오가는 광장. 물을 길으면서 얘기도 긷고 소문도 긷고 한 것.
주막집.
사립짝. 초가삼간의 시골집에는 울도 담도 없는 경우가 많다. 사립짝으로 된 사립문은 항시 비스듬히 열려 있었다. 나무 부스러기나 풀 사리로 만들어진 그 모양새 때문일까? 닫고 잠그고 해봐야 손으로 슬쩍 미는 것만으로도 무너지는 게 사립문. 누구나 출입이 자유로웠다. 낯선 사람조차도 헛기침 한번 토하고는 들어설 수 있는 문, 그런 게 사립문.
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기 위해 있는 문.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다. 디지털 도어록으로 꼭꼭 걸어 잠그고 아파트를 지키는 오늘의 우리로서는 영영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마당. 바깥마당은 마을 전체를 위한 광장.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거기서 하나로 어우러졌다.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제 크고 작은 도시에는 광장이 별로 없다. 혹 있다 해도 그건 그저 텅텅 빈 공터일 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우러짐이 없어지고 말았다. 마음 하나로 뭉치게 되는 그 어우러짐이 이젠 사라져가고 있다.
바자울. 울도 담도 없는 집, 울타리도 담장도 없는 집. 바자울은 풀과 나무로 세운 것이라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안채, 안방
아랫목
장독대. 안사람, 주부를 위한 공간.
아궁이. 지금은 가고 없다. 불기운이 삭은 지도 까마득하다. 오늘날의 부엌에는 아궁이가 없기 때문이다. 부엌에 가스 장치는 되어 있어도 아궁이는 없다. 한 집안의 더운 기운도 그만큼 식은 게 아닌지 모르겠다.
사랑채, 사랑방
마루, 대청마루
외양간. 요즘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 한 집안 가족이 사는 공간과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말이나 소를 기르는 공간. 사람 사는 뜰 안에 외양간. 한 식구나 마찬가지로 대접했다는 뜻.
또 다른 기둥 걸이: ‘올게심니’는 집 안, 안채 대청마루 기둥에 걸려 있던 그 무엇.
#마을에서, 집에서
경향(京鄕)이란 서울과 향촌이란 뜻, 서울 아닌 곳은 어디나 향촌이라고 일러 왔다.
집이 서로 이웃해서 몰려 있어서만 한 마을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마음끼리 열려 있고 어울려 있어서 비로소 한 마을이라고 했던 것. 헌데 저 박정희 정권 때의 ‘새마을 운동’인가 뭔가하는 것을 계기로 전통적인 향리가,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젠 영영 옛 모습을 못 보게 되고 말았다. 옛적의 마을 모습을 이젠 어디가서 찾는단 말인가.
#집안 식구들 돌아보면서
할머니 무릎
할머니 손, 약손
할머니 담뱃대
어머니 바느질
하고많던 그 일가붙이, 친인척들. 헌데 이제는 그게 달라지고 말았다. 대개가 한 가정에 외동아들 아니면 외동딸만 있게 마련이니 그들이 자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에게는 숙부 숙모도 외숙부 외숙모도 고모도 이모도 없게 마련. 이쯤이면 옛날로 치면 고아나 마찬가지다. 바야흐로 우리는 다들 그렇게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 저런 일
관례와 계례
장가들기와 시집가기
#몸치장, 몸 둘레
꽃신
보, 보자기, 단봇짐, 책보
깜장 고무신
#그 애틋한 먹을거리, 군것질거리
구워 먹었던 것들: 밤, 고구마, 감자, 콩 등
사냥해 먹었던 것들: 참새, 꿩, 토끼
서리해 먹었던 것들
누릉지
재강(술찌끼)
개떡
풀떼기
배고픔을 달래주던 것들
칡뿌리, 고욤, ‘고욤 일흔이 감 하나만 못하다’. 청시(삭힌감?)
까치밥. 까치 먹이 하라고 일부러 남겨둔 것은 아니다. 그것에는 다른 곡절이 깃들어 있다. 무엇에나 ‘마지막 하나’는 요긴하고 중요하다. ‘최후의 일각’,’최후의 일병’,..‘최후의 하나’, 마지막 남은 한 알이 다음 해 봄에 더 많은 감꽃을 피우게 하고, 그래서 보다 풍족한 열매가 달리게 하는 데 큰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옛사람들은 믿었다.
#귀에 사무치고 코에 서린 것들
소리들.
낙숫물 소리. 초가지붕 처마 끝, 거기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
타작 소리. 도릿깨
다듬이 소리
아낙네들 떨이하는 소리
방아 소리
풀피리, 버들피리 소리
닭 울음, 황소 울음
할아버지 담뱃대 터는 소리
할머니 군소리
냄새들.
깨, 콩 볶는 냄새
술 익는 냄새
누룽지, 숭늉
삼삼한 정경들
처마 끝 고드름
처마 밑 제비집
#사라져가는 풍습들
까치야, 까치야 헌 이 줄게, 새 이 다오. 지붕 위로 던져 올리며 소원을. 오늘날 개오지의 빠진 헌 이빨은? 치과병원 쓰레기통에…자! 그러니 이젠 새 이를 누가 가져다 줄까?
#갖가지 놀이들
마을 안 고샅이며 골목에서 아이들은 재잘댔다. 뜰이며 마당에서 법석을 떨었다. 아우성쳤다. 동구 밖 환히 트인 한길에서부터 뛰고 굴렀다. 달리고 돌아쳤다. 그런 놀이는 언제나 다사롭고 뜨거웠다. 재미의 김이 물씬물씬했다. 꿀맛 같았다. 그래서도 이내 넋을 팔았다.
하지만 이제는 감감 무소식이다. 고샅에 메아리치곤 했던 아우성을 이제는 컴퓨터의 클릭 소리가 삼키고 말았다. 누군가와 게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얼굴도 모르는 남. 그래서 오늘날의 놀이는 재밌을지언전 외롭다. 홀리는 재주는 있을지 몰라도 가슴이 통하고 흥으로 수런대는 놀이는 결코 아니다.
엿치기하는 그 잔치판. 엿치기하던 그 시절이 사뭇 그립다. 서럽게 아쉽다. 엿판도 엿가락도 가위 소리도 이젠 추억일 뿐이다.
돈치기.
짱치기와 소
자치기
비사치기
시차기
싸움이란 이름의 놀이. 닭싸움/ 깨금발 싸움, 깨금발 뛰기/팽이치기 싸움/수수께끼
#손에 익고 마음에 익은 연장들
똬리
물동이
낫
표주박
대 빗자루, 싸리 빗자루
불쏘시개
부삽, 부지깽이, 부집게, 부젓가락, 불손
성주단지, 터주항아리
회초리
지게. 지난 시절의 남정네들은 물건뿐만 아니라 인생이란 짐을 지고 나르면서 목숨을 부지했다
#사라진 장사들, 장수들
방물장수
엿장수
소금 장수
물장수
고물 장수. ‘니야카’
#지금은 까먹은 그 노래들
언니야, 오빠야
가갸 거겨
짱아 짱아 꼬옹 꼬옹
방귀 뀌는 뽕나무
비야 비야 오지 마라
해야 해야 나오너라